![[에너지칼럼] SAF 로드맵 발표… 정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1 [에너지칼럼] SAF 로드맵 발표… 정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 img1](http://gscaltexmediahub.com/wp-content/uploads/2025/09/img1.png)
한국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초기 혼합 비율은 1%로 시작해 2030년 3~5%, 2035년 7~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정유업계, 항공업계,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인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로드맵에는 연도별 의무 혼합 비율과 함께 SAF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SAF는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등 재생 원료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항공유다. 정부는 SAF 생산을 늘려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자다. 의무 이행은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국내 SAF 공급량을 연간 기준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유연성 제도를 병행해 이행량의 20%는 최대 3년까지 이월을 허용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도 추가할 계획이다. 급유의무는 국내 국제선 전편에 적용되며, 2028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는 미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유예를 받는다.
정부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SAF 사용량이 의무비율을 초과한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주고, SAF 혼합 급유편에 대해서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비행기 승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이나 좌석 우선 배정, 기념품 제공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 지원으로 SAF 산업 성장 견인
SAF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한층 강화된다.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인 재생합성 SAF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SAF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설비 투자와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미세조류 등 신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이오 원료에 대해서는 국내 관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원료 공급망 지도를 구축해 원료 수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칼럼] SAF 로드맵 발표… 정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2 [에너지칼럼] SAF 로드맵 발표… 정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 img2](http://gscaltexmediahub.com/wp-content/uploads/2025/09/img2.png)
항공업과 정유업 사이의 동상이몽
이 같은 정책은 세계적 SAF 시장 논쟁과 맞물린다. 항공사와 정유기업 사이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주장과 “공급이 뒷받침돼야 수요가 생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항공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SAF 가격이 기존 항공유의 2~3배에 달하는 점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3년 SAF는 전 세계 항공유 공급의 0.2%에 불과했다. 항공사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가격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유사들은 “항공사들이 장기 구매 계약을 맺지 않으니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셸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추진하던 SAF·재생 디젤 공장 건설을 중단했고, 이탈리아 에니(Eni)는 주문이 있을 때만 SAF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유럽은 이미 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EU는 올해부터 항공 연료의 최소 2%를 SAF로 채우도록 했으며,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도 2040년 22%까지 상향한다.
![[에너지칼럼] SAF 로드맵 발표… 정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3 GS칼텍스와 SAF 기념식](http://gscaltexmediahub.com/wp-content/uploads/2025/09/img3.png)
한국 SAF 로드맵의 의미와 과제
한국의 SAF 로드맵은 유럽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단계적 확대 등 유연한 제도 설계와 지원책 병행을 특징으로 한다. SAF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정책금융 지원,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관세 감면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강점이다. 특히 글로벌 원료 공급망 지도를 제작해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는 계획은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유기업 관점에서는 도전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경제성 부족이다. SAF는 생산단가가 높고 기존 정유공정을 단순 전환하기 어렵다. 국내 정유사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에 앞서 안정적 장기 수요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SAF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SAF 생산 기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민관 합동 컨소시엄으로 상업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이 뒤처질 경우 항공사들은 해외 SAF 수입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도 관건이다. SAF를 혼합할 때 함께 생산되는 바이오디젤·바이오 납사 등에 대한 국제인증 기준을 ICAO에서 논의 중인데, 한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 시장 진출이 막힐 수 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SAF 혼합의무제는 국내 정유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의무화를 기반으로 생산량을 늘려 글로벌 항공사에도 SAF를 공급할 수 있다면 항공유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 – 김리안 한국경제 기자
※ 본 콘텐츠는 한국경제 김리안 기자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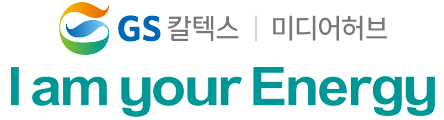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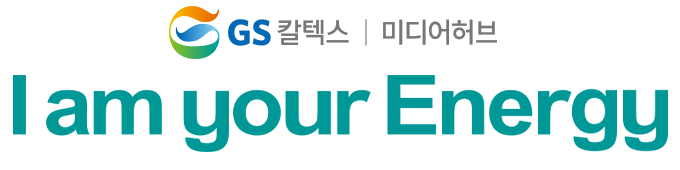
![[에너지칼럼] 글로벌 SAF 전환 가속화…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5 Thumbnail](https://gscaltexmediahub.com/wp-content/uploads/2025/06/SAF-Policy_Thumbnail.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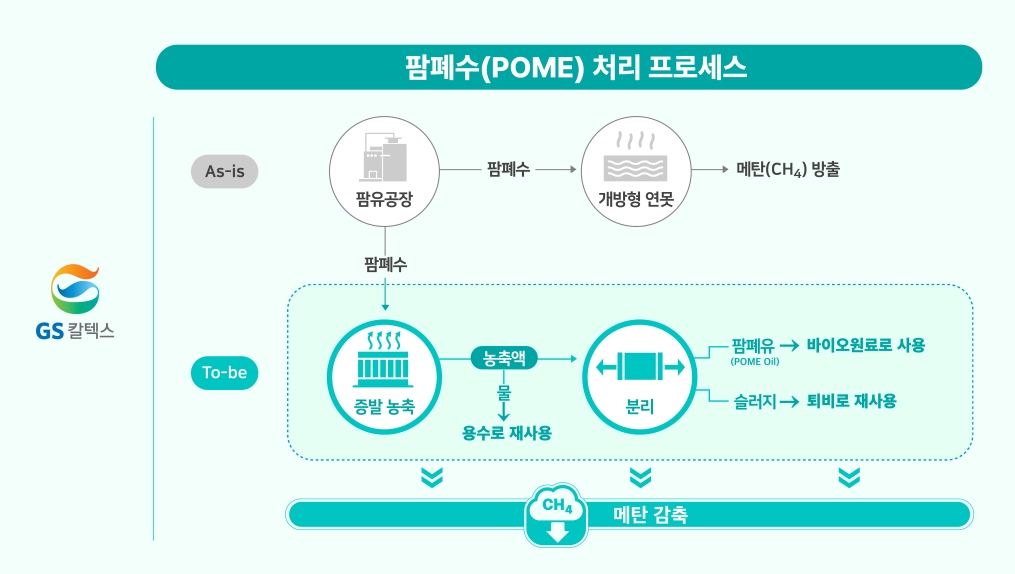
![[에너지칼럼] 수요-공급 선순환 논쟁에…불확실성 커진 SAF 시장 9 [에너지칼럼] 수요-공급 선순환 논쟁에…불확실성 커진 SAF 시장 | SAF market thumbnail](https://gscaltexmediahub.com/wp-content/uploads/2025/05/SAF-market_thumbnail.jpg)